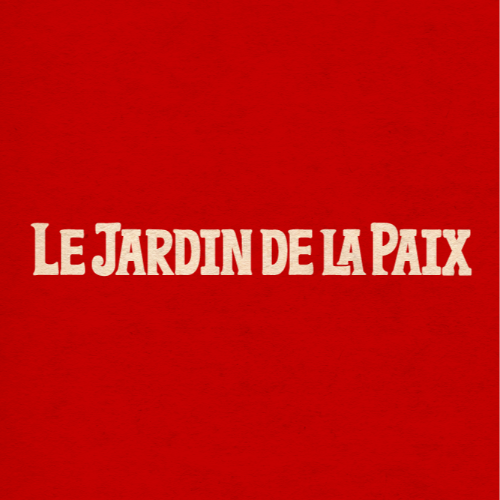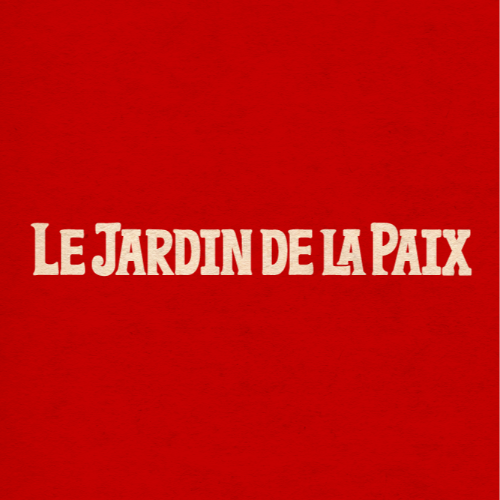우리는 여름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익숙해진 리듬, 햇살과 속도가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절은 멈추지 않습니다. 삶도 그렇죠.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관계의 결이 바뀌고,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이 문턱에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뇌가 ‘고통 자체’보다 ‘모르는 상태’를 더 위협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은 예측과 통제 가능성을 낮추고, 그때 전전두엽의 조절은 약해지며 전측섬엽(anterior insula)과 전대상피질처럼 불확실성과 갈등을 감지하는 회로가 경보를 울립니다. 이 경보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피부전도 상승, 동공 확대 같은 즉각 반응을 만들고, 상황이 길어지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결과가 나쁘더라도 확실하면 대비가 가능한데, 모르면 계속 대비 상태가 켜진 채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실험이 UCL(런던대)의 연구입니다. 참가자 45명은 화면 속 바위를 뒤집어 뱀이 숨어 있으면 약한 전기 자극을 받는 게임을 했고, 바위마다 충격 확률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0%와 100%의 ‘확실한’ 상황보다 확률을 ‘모를 때’ 스트레스 반응이 가장 컸고, 피부전도와 동공 크기 같은 생리 지표가 그 불확실성 곡선을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오히려 확률을 더 잘 학습했다는 것. 불확실성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배우고 대비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딱 이렇습니다. 내일 기온이 어떻게 출렁일지, 비가 언제 내릴지, 수확의 맛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노련한 정원사는 계절을 멈추려 하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 ‘작은 확실성’을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을 합니다. 흙을 만져 수분을 직접 확인하고, 잎을 들어 통풍을 체크하고, 오늘 정리할 가지를 정해 실행하죠.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수면·알림·걷기·첫 한 시간의 집중처럼 내가 당장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을 선택하면, 뇌는 “지금은 대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행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해 경보를 낮춥니다. 이것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정이고, 이러한 시기는 흘려보낼 것과 내가 할 것을 분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계절을 바꾸지 못하듯, 타인의 속도와 말투, 판단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서두르고, 누군가는 게으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경쓰이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두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나를 위해 써야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물 주기를 하고,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고, 내 정원의 통풍을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분이나 세상의 소음이 내 루틴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정원에서는 이것이 건강입니다. 삶에서는 이것이 지속성이구요.
다시 정원으로 돌아오면, 한여름의 끝에야 비로소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잎이 마르게 내버려 두면 병의 발단이 됩니다. 치우고 모아 퇴비통에 넣으면 몇 달 후 가장 좋은 거름이 되죠. 같은 잎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정원사는 이 타이밍을 압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흘려보낼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우리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타이밍을 잘 알아챌 수 있어요. 지나간 대화, 다한 관계, 내 몫이 아니었던 기대와 평가를 발 밑에 쌓아두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퇴비통으로 옮겨 이름을 붙이고, 그 경험에서 배운 한 줄 메모를 남겨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음 계절의 영양분이 됩니다.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지속입니다.
지금까지 에피소드 10개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모종을 심었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법을 익혔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쳤습니다. 폭염 속에서 생존을 배웠고, 상처를 지나 새순을 확인했고, 분갈이와 인내, 그리고 결실을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거대한 성공담이 아니라 작은 결정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의 물주기, 오늘의 가지 하나, 오늘의 한 호흡. 그래서 저는 한여름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마음은 자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계절 속에서 계속 가꿔나가는 일입니다.
세상은 때로 제 멋대로 일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까지 10개의 이야기는 그 리듬의 초안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순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하는 힘. 오늘의 작은 손길이 내일의 정원을 만든다는 단순한 사실을 믿어보는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내 일정을 물 주기처럼 계획하되, 횟수로 강박을 만들지 않고 컨디션이라는 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화분 간격처럼 둡니다. 숨 쉴 틈이 없는 관계는 결국 곰팡이를 부릅니다. 영양은 과도한 양이 아니라 맥락과 깊이에 중점을 둡니다. 수확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칭찬과 보상은 조금 빠를 때 더 달콤하고, 너무 늦으면 즐거움보다 허무가 남습니다. 위생은 기록과 정리입니다. 오늘의 생각과 감정을 짧게라도 적고, 책상 위를 정리하는 일이 다음 계절의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정원사의 손놀림은 삶의 기술과도 같습니다.
다시 불확실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를 때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확실한 작은 행동,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어 실제 빛을 확인하고,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오늘의 한 가지를 정해 타이머를 돌리는 것. 이 작은 확실성들이 뇌의 경보를 가라앉히고,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원에서 흙을 만져보고 물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확실성입니다. 바뀌는 시기의 계절은 모호하지만 손끝의 흙은 구체적입니다.
모르는 일은 모르게 두고, 서두르는 사람은 그렇게 두고, 말 많은 평가는 흘러가게 둡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내 정원의 리듬을 반복합니다. 아침의 빛, 낮의 통풍, 저녁의 정리, 주말의 휴식. 이 리듬이 쌓이면 다음 계절의 나를 지탱하는 근력이 됩니다. 저는 약속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계절을 바꾸지 않되, 계절 속에서 변화를 만든다. 결과를 확정하지 않되, 오늘의 손길을 확정한다. 남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나의 루틴을 설계한다. 이 단순한 약속이 더 단단한 삶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시작은 늘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루틴, 오늘의 작은 정리, 오늘의 잠깐의 휴식. 한여름의 끝에서 우리는 계절을 붙잡지 않고, 계절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지속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볼게요. 흙으로 판단하기, 통풍으로 지키기, 질소를 줄이고 칼륨을 늘리기, 떨어진 잎은 퇴비로 돌리기, 수확은 조금 이르게, 비교는 조금 늦게, 그리고 한 문장. "계절은 바뀌지만 마음은 계속 자란다." 여러분의 정원과 마음에 부드러운 가을빛이 잘 스며들길 바랍니다.
아, 한 가지 덧붙이면 늦여름 직사광선에서 갑자기 그늘로 옮길 때 식물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땐 차광막을 하루에 한 시간씩 늘려가며 서서히 적응시켜 보세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환보다 미세한 조정이 멀리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알림을 10퍼센트만 줄이고, 산책을 10분만 늘리는 식으로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듯, 세상의 흐름도 막을 수 없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지키는 루틴, 내 삶의 지속성을 가꾸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큰 변화의 그림을 그리되, 작은 조정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속의 기술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나만의 작은 확실한 것들로 계속 가꿔나가면 됩니다.
한여름의 끝에서,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갈 준비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