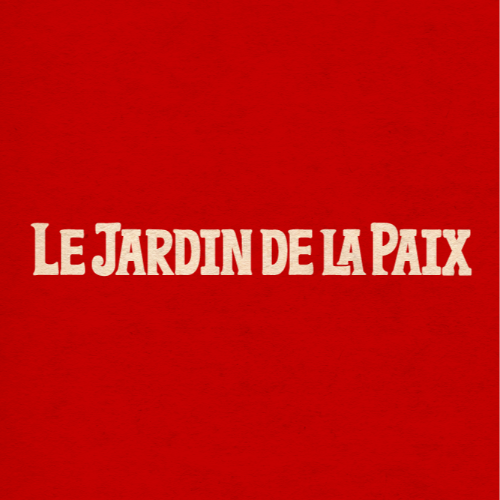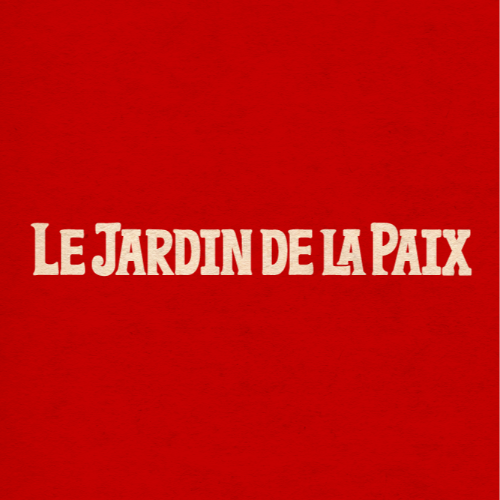식물에게 물을 주면 참 흥미로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축 늘어져 있던 잎은 물을 주고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힘이 살아나 있죠.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대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식물은 물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매일같이 물을 주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습 상태에 빠지게 돼요. 물을 지나치게 머금은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해 결국 썩고 말아요. 중요한 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일같이 수백 개의 뉴스, 영상, 메시지, 알림, 댓글들이 쏟아지죠. 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하지만 뇌는 이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의(attention)는 아주 제한된 자원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을 주어도, 천천히 빨아들일 시간과 틈이 없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량을 절반으로 줄인 그룹은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 23%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단순히 20%대 점수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예요. 인지심리학에서는 그 정도만 되어도 뇌가 완전히 다른 기어로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과습되는 것처럼, 정보를 과하게 받아들이면 뇌도 과습 상태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흙은 바삭바삭 말라서 물을 부어도 한참 동안 위에서 맴돌기만 하고,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립되고, 관계에서 멀어지고, 감정을 나눌 기회가 적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좀처럼 스며들지 않아요. 사회적 고립이 해마의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도 있어요. 6개월 이상 사회적으로 고립된 실험 쥐들의 해마 뉴런 가지치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혼자 지내는 동안 마치 말라비틀어진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얼마만큼 주어야 할까요?
식물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깊게, 자주는 아니게’ 주는 게 좋아요. 식물 물주기의 황금 비율이라고 할 만하죠. 자주 조금씩 주면 흙이 마르지도 않고 과습도 되지 않아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뿌리가 얕게 자리 잡아 건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져요. 한 번 줄 때 충분히 흙 아래까지 스며들도록 주는 게 중요해요. 토양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헷갈린다면 나무 막대를 뿌리를 피해서 깊이 찔러보았다가 빼보세요. 흙이 묻어나오는 깊이를 보면, 그곳까지는 아직 물을 머금고 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겉흙만 적셔주면 식물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매일 톡으로 ‘뭐해?’, ‘자니?’ 같은 이야기만 주고받는 관계보다, 가끔 만나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단단해 집니다.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습니다. 밤에 주면 흙이 젖은 채로 오래 있어 병에 걸리기 쉽고, 한낮에는 기온이 높아 물이 금세 증발해버리거든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진행한 ‘주의 전이(attentional switching)’ 연구에서도 아침의 30분이 하루의 집중 방식을 결정한다고 밝혔어요. 아침에 뉴스 요약본을 읽은 그룹과 짧은 영상을 본 그룹을 비교했더니, 오후 집중력 유지 시간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고 해요. 뇌가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고 일찌감치 설정을 마치는 거죠. 아침에 물 한 컵으로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 심심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모닝페이지를 쓰거나 짧게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주고 나면 받침에 고인 물은 꼭 비워줘야 해요. 그대로 두면 뿌리가 물에 잠겨 숨을 쉬지 못하거든요. 고인 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던진 말, SNS에서 본 비교되는 삶, 혹은 지나간 감정이 마음 받침에 오래 고여 있으면 결국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돼요. 신경과학자인 브루스 맥이웬(Bruce McEwen)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부정적 감정 노출이 해마와 편도체의 연결을 줄여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물을 주고 나서 흘려보내는 연습도 그래서 필요해요.
물주기의 핵심은 ‘깊게, 자주는 아니게’예요. 정보도, 관계도, 감정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주면 숨이 막히고, 너무 적게 주면 메마르죠. 물을 잘 주면 식물이 잎을 활짝 펼치듯, 우리도 좋은 정보를 만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면 뇌가 도파민을 조금씩 분비해 세상이 훨씬 흥미로운 곳으로 보여요. 그 작은 흥미가 쌓이면 다시 살아볼 만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 마음은 과습 상태였나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말라 있었나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어 한 번 마음에 물을 주어보세요.
깊게, 그러나 자주는 아니게.
그러면 또 내일은 조금 다르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